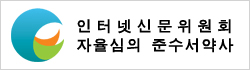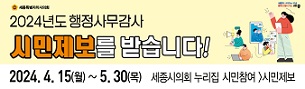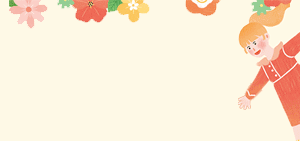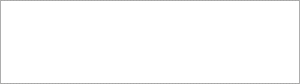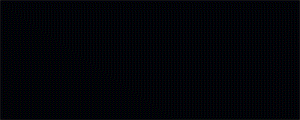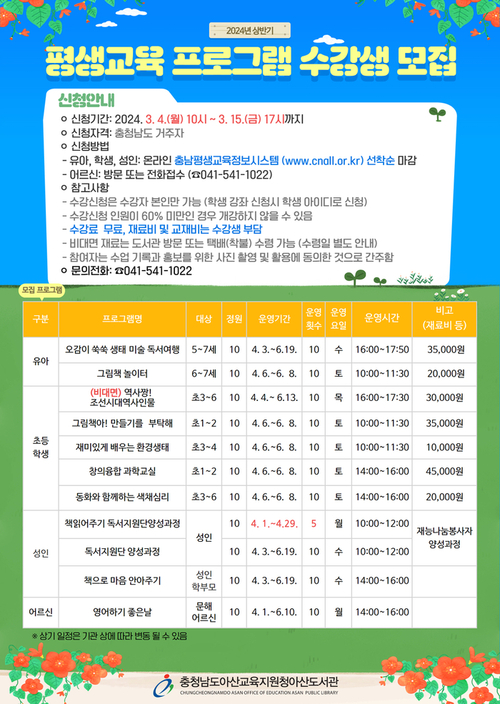배울 학(學)자는 상형자다.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 그 글자를 찬찬히 뜯어보면 아이(子)가 책상(冖) 앞에 앉아 두 손(臼)으로 뭔가 배울 것(爻)을 펴들고 공부하는 형상이 비친다. 이 글자가 만들어진지 이미 수천 년. 그 때도 배움은 그렇게 이루어졌던가 보다. 책상 앞에 뭔가를 붙들고 앉아 익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배울 학(學)자는 공부의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글자로 치기도 한다. 공부가 이루어지는 자리와 그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실,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 배울 것을 붙들고 우직스럽게 파고드는 것이, 예나 이제나 바뀔 것 없는 면학의 기본자세일 듯싶기도 하다. 요즘도 많은 학부모나 교육자들이 그 관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학생들을 최대한 책상 앞에 붙들어 두고, 오직 책이나 파도록 하는 게 공부의 왕도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불안해 배길 수가 없다. 그러고 나야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하는 줄로 여겨져 마음이 놓이고, 교사도 책임을 다한 듯해 안심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배움의 방식과 형태가 그 글자(學)를 만들던 고대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부에 대한 이 고전적 포즈는 언제까지 면학의 기본자세로 떠받들어져야 하는 것일까. 21C에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본보기일까. 지식정보화 사회로 들면서 학력의 개념부터 재정립되고 있다. 배운 것을 얼마나 외워 쓸 줄 아느냐가 종래의 잣대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힘이 진정한 학력인 시대가 되었다. 20C 산업화 사회가 기억력・이해력・적용력이 필요한 사회였다면, 21C 지식정보화 사회는 사고력・탐구력・창의력・상상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사회다. 그것이 미래를 연구하는 석학들의 한결같은 예측들이다. 그런 능력들은 책상 앞이나 책 속에서만 찾아지지 않는다.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모든 현장이 학습의 장이 되고, 인터넷・TV 등 모든 매체들이 교과서가 되는 시대로 들고 있다. 그렇기에 이젠 학생들을 더 이상 책상 앞에만 묶어두려고 해선 안 된다. 그것은 아이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드는 길일뿐이다. 광야를 달릴 말을 고삐로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 그 고삐에 매이고 만다. 우리 속담에도 “명마(名馬)가 고삐에 상한다.”는 말이 있다. 고삐에 매인 말은 처음에는 벗어나려고도 해 볼 테지만, 이내 좌절과 체념, 무력감에 길들여지게 된다. 그러다 종내는 고삐가 풀려도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그 말에게 더 이상 광야는 없다. 아이들에게 세계무대의 주역이 되라면서 책상 앞에만 묶어두는 교육,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라면서 밤늦도록 교실에만 붙잡아두는 교육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눈먼 아집의 고삐를 끊지 않은 채, 아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이야 말로, 맹목적 교육열에 불타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공부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해보자고 권하는 이유다. 김 병 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병 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ksu-n@hanmail.net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